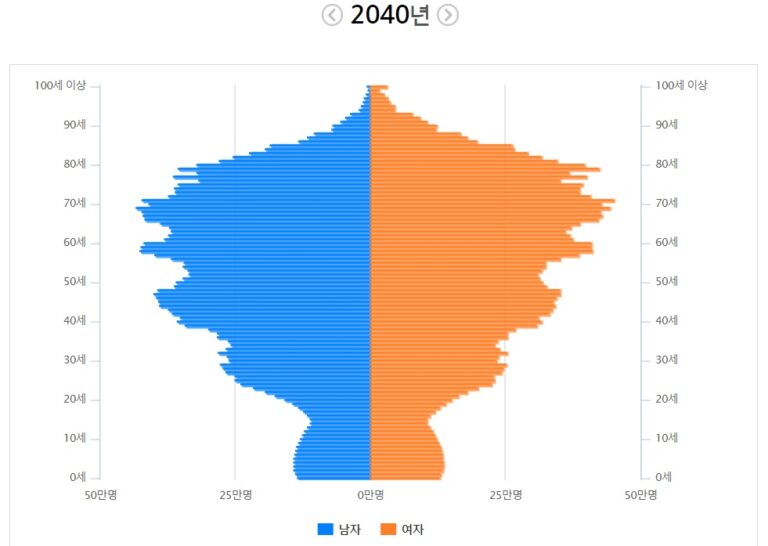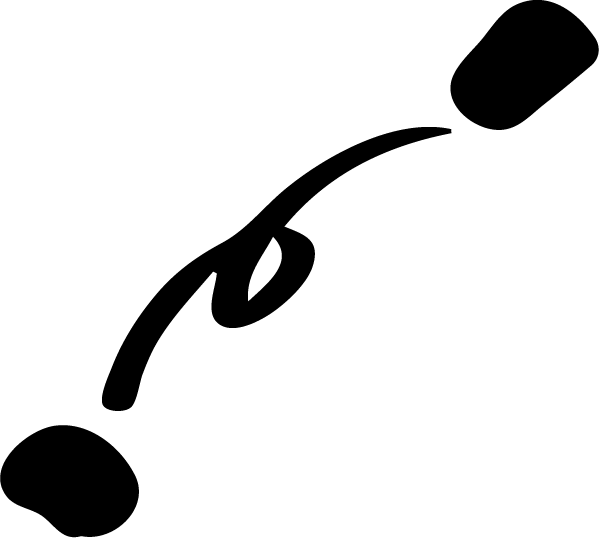안락사 가위바위보
“이제 저 좀 죽여달라”고 사정하던 99세의 노인이 어느 날 새벽 수액줄에 목을 감아 자사自死했다. 와락 다가온 사건이었다. 마치 나 홀로 양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듯, 다음처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이라는 추상은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영역인가? 죽음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나? 질병과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하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격으로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걸까? 질병과 고통마저 남김없이 살아내는, 생의 남은 한 방울까지 짜먹는 일은 삶의 풍부함을 누리는 행위인가? 안락사는 운명의 자기결정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정해진 운명을 앞당기는 행위일 뿐인가? 안락사의 요청은 자기 삶으로부터의 무책임한 도피인가? 아니면 자기책임의 윤리 안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