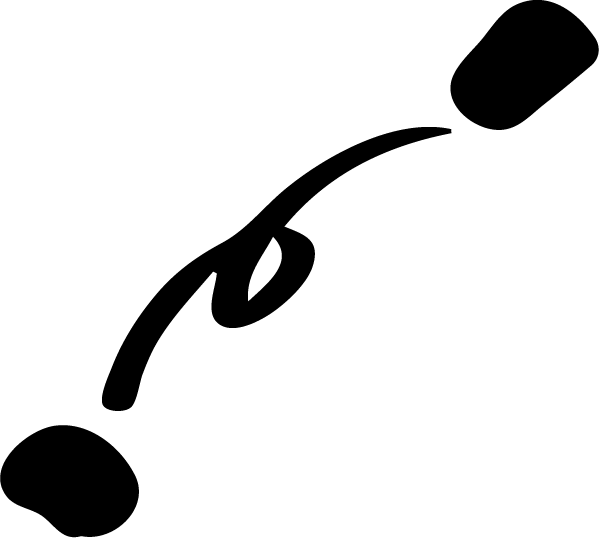따로국밥 상호작용 ‘우리가 남이가’
최근 문화공동체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업무적으로 엮이는 일이 있었다. 그들의 독자적인 운영 방식을 보고 있자니 ‘공동체’를 어찌 이리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예술 속 세계는 늘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일부 지식인으로 치부되는 이들의 보수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목소리나 창의적인 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일부 단체는 권력 남용을 통한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말로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겉으로는 잘 포장된 속 빈 강정 같다.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이 그리 힘든 일일까? 그들의 무례함에 여러 번 따져 물어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순진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단체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