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말해지지 못한 것들이…
산 자가 산 자 대신 말하는 대의민주제는 오늘날 완전히 희망을 잃은 듯 보인다. 그런 사정과 별개로, 죽은 자는 여전히 산 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산 자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배회하거나 같은 자리에 결박된 채 억눌려 있을 뿐이다.
금번의 포럼 ⟨여기에 뼈가 있다⟩는 경산 코발트 광산에 여전히 매장된, 최대 약 삼천 오백 구로 짐작되는 유골들의 분한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기획되었다. 한편으론 일제강점기에 주요한 전쟁 물자로 취급되었던 광물인 코발트와, 채굴을 위해 징용된 선조들의 서사가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애쓰려고도 했다. 그러나 광산 내부에 직접 들어가 유골들과 조우했던 참여자들은 어떠한 강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령에 홀린 듯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장소를 미소화했다. 여타의 주제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장소의 단편적 사실만을 가까스로 길어 올렸고, 결과적으로 이는 코발트 광산에 겹겹이 얼룩진 역사를 재현하려던 입장에선 크나큰 결책이 되었다.
재현의 논리는 인식의 문제와 숙명처럼 얽혀 있다. 장례를 통해 죽음을 순화하는 정신문화 전반을 다룬 서론에서도, 대구미래대와 사과의 삼각측량을 통한 광산의 좌표계에서도, 광산 주변을 어른거리는 한 소인의 소설에서도, 역사의 리얼리티를 달아보는 저울과 무언가가 묻혀 있는 대지의 유동을 살펴본 글에서도 제국주의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제국주의와 반공주의가 마치 성호를 긋듯 상이한 시간대에 교차했음에도 편마비를 앓듯 나머지 반편을 전혀 다루지 못했다. 이는 곧 우리의 재현이 불완전했으며, 윤리적으로 치우쳤음을 뜻한다.
정강산의 글이 주지하듯, 여기서 일어난 학살은 신에 의해 자행된 듯 불가해한 사건이 아니다. 20세기라는 저 거대한 불길이 휩쓸고 가면서 남긴 화흔이고, 최종적으로는 치유되어야 할 잿가루다. 이 역사적 보편은 보물(섬)에서 해골로 향했듯, 반공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민족주의에서 제국주의로 거슬러 올라가며 논의를 확대했어야 할 터였다. 아우슈비츠를, 삼풍백화점을, 대구미래대, 소인, 장례문화를 이곳 코발트광산과 연관시켰음에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는 실패한 자들의 모험담이다. 빗금 하나를 유실했기에 X자 표적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의 모험담. 그렇기에, 그것들은 아직도 그 장소에 있다.
그들은 버티고 있다. 만전을 기했던 시도가 겨우 그들이 묻힌 장소를 가리키는, 어설프게 필사한 지도로 변용되었단 사실에 씁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침묵이 번져가도록 놔두지 않으려던 우리의 뜻이 그곳을 은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기꺼이 바란다. 진실이 꾸깃꾸깃하다고 해서 그것을 소각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패로만 부르고 싶지 않다. 뚝뚝 떨어지는 비애를 담아, 희망이라 부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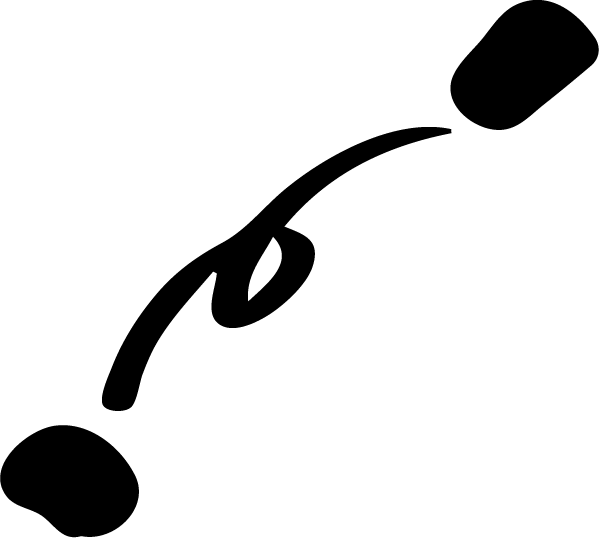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