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은 많은 경우 ‘독일 관념론 체계를 완성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그는 그 자신의 체계도 완성하지 못했다. 사실, 그가 출간한 저작은 <정신현상학>, <논리의 학문>, <백과전서>, 그리고 <법철학 강요>, 이렇게 넷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중에서 ‘학문적 엄밀성’을 갖추어 상술한 저작은 오직 <논리의 학문>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정신현상학>은 앎(Wissen; knowledge)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학문(Wissenschaft; science)의 관점에 도달한 정신의 ‘일대기’에 대한 서술, 즉 학문 체계라는 고원 등반에 성공한 정신의 이야기이지, 그 자체로 ‘학문의 체계’에 대한 서술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흔히 헤겔의 주저로 알려져 있는) <정신현상학>은 헤겔이 이제야 비로소 ‘체계’를 펼칠 준비를 끝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지(das absolute Wissen; absolute knowing)’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주관-객관의 대립을 넘어서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했다는 것을 뜻하지, 마치 절대반지를 얻은 듯 세상을 끝장낼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다.(이는 데카르트의 <성찰>이 진리를 발견해나가는 도정에 대한 그의 사유기록이고,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철학의 원리>인 것과 유사하다.)
<정신현상학>(1807)이 출간된 지 10년 쯤 지나 헤겔은 <논리의 학문>의 1, 2, 3부를 완간한다 (1부 ‘존재 논리’ – 1812년, 2부 ‘본질 논리’ – 1813년, 3부 ‘개념 논리’ – 1816년). <논리의 학문>은 헤겔의 학문 체계 전반의 ‘방법론적’ 근간을 이루어, 체계에서 맨 앞에 온다. 그의 전 체계의 개요를 담은 <백과전서>에서도 <논리의 학문>은 제1부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백과전서>. 방금 언급했듯, <백과전서>는 전 체계의 개요다. <백과전서>의 온전한 제목은 <철학적 학문들의 백과전서에 대한 강요(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encyclopedia of philosophical sciences in outlines)이다. 즉, <백과전서>는 체계의 각 분과영역을 서술하되,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요점만 간단히’ 한다. <법철학 강요(Grundlinien der Rechtsphilosophie; outlines of philosophy of right)>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법철학이라는 분과영역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테제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왜 헤겔은 이러한 ‘강요’들을 출간했을까? 이 두 개의 ‘강요’는 <논리의 학문>을 토대로 체계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던 헤겔이 강의를 위해 집필한 교재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요점 및 테제만 갖춘 교재들이다. 헤겔은 <백과전서> 출간 당시 자신이 강의 중간에 수시로 메모해 넣을 수 있도록 인쇄된 페이지 사이사이에 백지를 끼워 넣은 특별본을 제작해 줄 것을 출판사에 부탁했다. 이처럼, <백과전서> 및 <법철학 강요>는 강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성격을 가진 텍스트들이다. 헤겔은 강의 도중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백에 적어 넣고 이미 출간된 내용 중에서도 다음 출간본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곤 했을 것이다.
<법철학 강요>와 관련해서는 강의를 위해 헤겔이 자신이 적어둔, 아직 채 문장이 되지 못한 단편적인 메모들이 꽤 많이 전승되었고, 헤겔의 저작을 20권으로 편집해 내어놓은 주어캄프(Suhrkamp) 출판사는 이 메모들을 본문 각 절 아래에 삽입했다. 또한 주어캄프는 이 두 ‘강요’를 편집·출간하면서 수강생들이 받아 적어 놓은 노트들의 내용을 간추려 ‘보충(Zusatz)’ – 영어로는 ‘supplement’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 이라는 제목 아래 모아 놓았다. 이는 분명 ‘강요’의 성긴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다년간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강의들 중 어느 해 어느 학기의 것에 대해 누가 받아적은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누락된 채 편집자의 자의에 따라 뭉뚱그려진 것이다.
비판적 고증을 보다 중시하는 펠릭스 마이너(Felix Meiner) 출판사에서 아직도 간행 중인 헤겔 전집에서는 헤겔의 수기 메모와 ‘보충’은 제외하고 당시에 출간된 내용만을 그대로 재출간하였다. 대신, 수강생들의 노트들은 전집의 II부에 따로 출간되고 있다. 이렇게 전집을 I부와 II부로 나눌 만큼 노트들의 분량은 방대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헤겔의 유일한 ‘학문적 저술’은 <논리의 학문>뿐이다. 이것이 이 저술의 제목이 <논리학(Logik; logics)>이 아니라 <논리의 학문(Wissenschaft der Logik; science of logic)>이 된 이유라고 나는 짐작한다. <백과전서> 1부는 이 <논리의 학문>의, 강의를 위한 축약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벌써 눈치챈 독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체계의 철학자’ 헤겔은 단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부단한 과정에 있던 철학자이지, 체계를 ‘완성’한 철학자는 결코 아니다.
헤겔은 연구실에서 고독하게 체계 구축에 몰두하기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각 분야의 체계를 만들어나갔다. 전 체계의 토대가 되는 <논리의 학문>을 출간한 이후, 그는 <자연철학 강의>, <법철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미학 강의>, <철학사 강의>, <세계사의 철학 강의> 등 각 분과영역에 대한 강의를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그가 베를린 대학 교수로서 죽을 때까지 분과마다 3차례 내지 5차례에 걸쳐 강의하였다. 그러니까, 분과영역들 중에서는 ‘법철학’만이 개요를 담은 교재와 더불어 강의가 진행되었다. 나머지 영역들은 헤겔 자신이 쓴 강의원고를 토대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펠릭스 마이너 사의 헤겔 전집 출간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인 발터 예쉬케(Walter Jaeschke)는 이를 구분해 ‘법철학 강의’나 ‘백과전서 강의를 ‘개요서 강의(compendium lectures)’라고 부르고, 교재 없는 나머지 강의들을 ‘원고 강의’라고 불렀다. 헤겔의 체계는 그의 죽음(1831) 직전까지도 강의를 통해 형성 중이었던 것이다. 헤겔 전기를 쓴 테리 핀카드(Terry Pinkard)에 따르면, 헤겔은 강의를 받아 적은 학생들의 정서노트가 유통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자신의 사상이 강의에서 전달된 형태로 완성된 것 같은 인상을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주기 때문이었다.
헤겔 자신은 유창한 언변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러한 어눌한 말솜씨를 역이용해 강의 현장에서 사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재능을 지녔었다고 한다. 테리 핀카드는 이를 손에 잡힐 듯이 우리에게 묘사해 준다. “그는 단순히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사유는 이미 종결되어 그것의 결과만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점을 그 자신을 실례로 보여 주어 증명하려 했다. (베를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또 다른 형태는 우아하고 세련된 슐라이어마허의 방식이었다.) 헤겔은 자신의 방식을 완벽하게 완성했고, 자신의 가장 큰 결점 – 더듬거리는 말투, 세련되지 못한 태도, 때로는 어색한 행동 -을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헤겔은 한 문장을 완성하고는 잠시 멈추고 헛기침을 한 다음 같은 문장을 고쳐 말하고는, 기침을 하고 원고를 천천히 넘긴 뒤 마침내 같은 문장을 세 번째로 새롭게 표현하면서 문제를 단숨에, 그리고 명쾌하게 해결해 버렸다. 학생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것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과정을 느꼈다. 헤겔의 즉흥적인 방식은 자칫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강의에 창조적인 느낌을 불어넣었다.” (테리 핀카드, <헤겔>, 전대호·태경섭 옮김, 787쪽)
그러나, 헤겔은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청중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재능을 발전시켰을 뿐만은 아니다. 헤겔의 사상 자체가 강의를 통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완성’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의미심장한 단어다. ‘완성’을 의미하는 ‘Vollendung’은 ‘끝’을 의미하는 End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어, ‘끝냄’, ‘끝장냄’이라는 어감을 강하게 지닌다. 헤겔은 끝(장)내고 싶었지만 끝(장)내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끝장냄’, 즉 체계를 완전히 닫히게 하는 일은 헤겔에게 하나의 이념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념이다. 헤겔 사후 100여 년 후에 그의 철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남용한 나치는 ‘최종 해결(Endlösung)’을 위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최종적인 완결’을 구현한다는 것은 늘 이념으로 남지만 반드시 이념으로만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완결이 단지 이념의 방식으로 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헤겔 해석의 가장 큰 물음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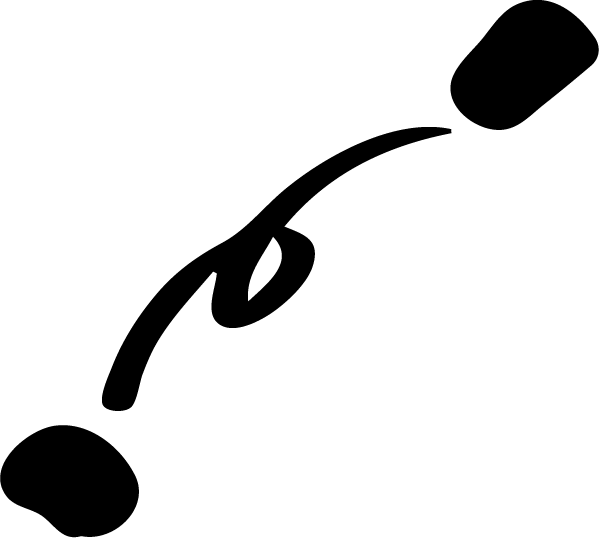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