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독, 사랑, 목구멍을 넘어가는 인용부호들: 김재원의 작업과 함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될 때, 그 말들을 아랫입술과 이빨 사이에 보관해 놓았던 것 같다. 이 느낌은 진짜 친한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 느껴졌다.”[1]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십여 년 전에 일기장 종이에 눌러쓴 이 구절을 피해 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2] 매번 김재원 작가의 작업을 눈앞에 두고 떠올릴 때, 그의 작업을 휘감고 있는 서사에 빈번히 ‘나’의 서사가 끼어드는 탓이었다.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통각으로 남겨진 ‘나’의 ‘지난날의 구토’와 같은 감정들이 전시장에서 불쑥 등장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임을 이 글을 읽는 이들은 이해할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것은 아랫입술과 이빨 사이에 담아놓았던 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겨우 흐릿해진 그 말들이, 입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올 듯한 기분이었다. 고해소에 들어간 것마냥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달싹이는 ‘나’의 모습은 그의 작업에 자꾸만 대답을 걸고자 하는 충동을 되뇌이게 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 내러티브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퀴어와 감염인의 서사는 ‘나’가 완벽한 이해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기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캠프’를 경유해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다. 캠프 취향과 동성애 사이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연관성 상에서 이들이 캠프 취향에 전위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지만 그 취향 이상의 것으로 여겼던 시기처럼 말이다.[3]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 역시 한계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캠프’라는 용어는 하찮고 피상적으로 퀴어를 의미하는데 활용되었다고 일찍이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커뮤니티에 깊게 뿌리 잡은 중요성까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배경에 있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이성애도 아닌, 인간적인 사랑의 측면의 언급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들 스스로 존재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전제들이 소극적으로 수용되어 왔다는 것이다.[4] 편집된 퀴어와 그 감수성의 소비 사이에서 있던 ‘캠프’는 한 비평가의 단상에서부터 인용부호를 붙잡고 여러 문장을 떠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그 ‘캠프’를 다시 붙잡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붙잡지 못할 것을 직감한다. 대신 파편화된 작가의 서사에서 불쑥 등장하던, ‘나’의 말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충동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몇 년간 떠올렸던 인용구들 사이에 맴도는 모양새다.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비감염인 이성애자가 그의 작업들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독해를 시도하면서 휩쓸리듯이 맴도는 멀미 같은 느낌이었으리라. 이 글은 그렇게 ‘나’가 맴돌았던 문장들을 경유하면서 김재원 작가의 개인전을 따라가 본다.
섬
“어떤 한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으며, 거기에는 단절이 있다. … 우리는 서로 교통(交通)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의 어떤 교통의 방법도 원래의 거리를 좁힐 수는 없다.”[5]
그의 개인전 《그때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ROOM 806-2, 서울, 2020)은 장소명처럼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흔하게 보이지만 가려지는 장소를 은유하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질 즈음이었기만 그 장면은 전시장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낯설게 만들었다. 한 가운데에 놓인 침대와 수건걸이, 커튼, 어지럽혀진 이불과 베개의 의미는 명백하였다. 리플렛마저도 보통 그곳에서 일회용품을 담는 파우치 안에 담겨 있었다.[6] 종유석처럼 내려오고 쌓인 약통에서 타인이 닿지 못할 질병의 깊이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 질병의 구체성은 벗겨진 라벨들처럼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깊은 웅덩이는 그의 영상들이었다.
침대 뒤편에 위치한 <구속의 섬, 낙원의 섬>(2020)은 그 ‘모텔’의 특수성을 일견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을 여는 소리, 캔을 따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는 연달아 배경음으로 등장하고, 흩어지는 말들은 마치 하나의 오토픽션(autofiction)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전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허구인 것.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들이 중간에 등장한다. 7월, 10월, 11월. 영상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은 허구라 믿은 매끄러움 사이 갑자기 등장하는 구멍이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 같은 것이었다.
게이 커뮤니티를 차치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모텔은 여러 층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맥락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장소가 ‘모텔’이라 인지되기 시작하는 지점에는 일정 부분 사랑의 소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곳은 자본주의의 끝없는 회전율이 만들어내는 흔한 지나감이 아닌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데, 사랑을 말하는 이와 대화의 형태로 신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감정이 사라진 뒤에서야 온전히 덩그러니 남겨진 침대가 눈에 들어온다. 이 침대는 작가가 경험했던 병원 1인실의 장소성과 겹쳐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입원실과 모텔의 기저에 흐르는 섬을 만드는 심연이다. 그것은 ‘우리’가 불연속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는 ‘우리’이다. 관련하여 바타유는 에로티즘에 대해서 죽음까지 인정하는 삶이라고 언급한다. 부연하자면 세포와 같은 무성 생식에서 둘로 분리되면서 처음 것이 죽음에도 그다음 것 사이에서 연속성의 순간을 찾을 수 있는데, 소멸하는 개체인 우리는 결국 최초의 연속성에 대한 집념을 곧잘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포의 차원에서부터 질기다 못해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을 기억하고, 그것과 함께 쌓이는 약병을 함께 중의적으로 병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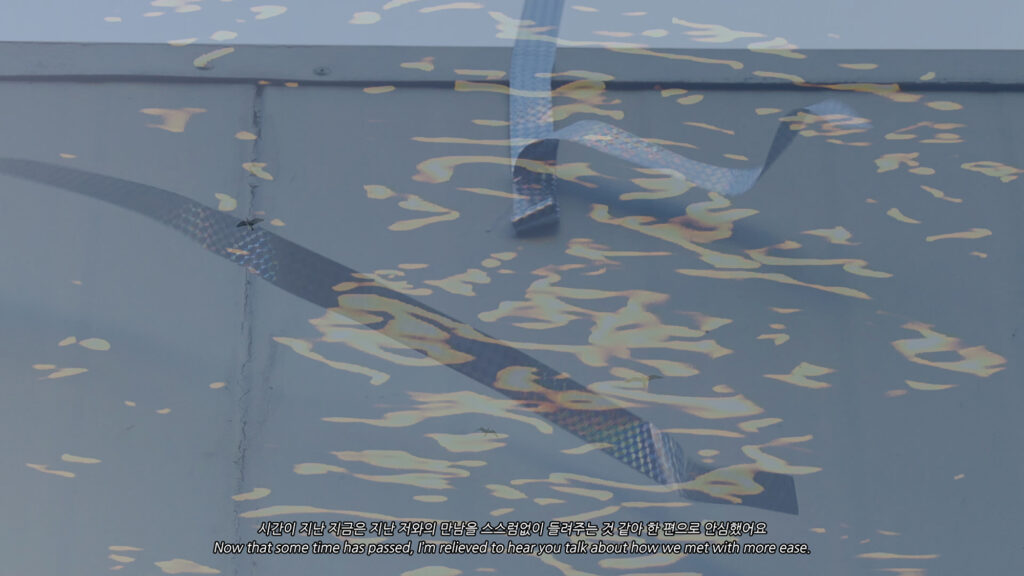
배반
“… 그 뒤 제가 부끄럽게 여기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을 언어, 이 두 언어 사이의 긴장 속에, 심지어 찢김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죠. 글을 쓰면서 어떻게 나의 출신 세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8]
예상치 못하게도 문제는 <지난날의 구토>(2020)였다. 그것은 ‘나’에게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웅덩이였던 것이다. 이 짧은 영상의 구조는 단순했다. 영상 전반 오버랩되는 물결에 한 편의 서간문의 형태로, 지난날을 회상하는 자막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H가 J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실패한 사랑의 회한처럼 보이기도, 우울감의 표상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8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한다. 허구의 매끄러움으로 자막이 넘어가야 했는데 그 자막이 구멍을 내버렸다. 작가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멈출 반동을 잃어버렸다. 재건되지 못한 채 폐허처럼 남겨진 감정을 난생처음 직면했을 때, 그리고 이후의 폐허들이 차마 지나가지 못하면서 몸 안에 남겨진 잔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니셜로 수렴된 영상 속 수신인과 발신인은 길을 잃고, 애증의 감정이 담긴 말들이 발화되면서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이곳저곳 옮겨지게 된 것이다. 발신인이 만약 바이러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에 전염성 역시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답이 없는 그 편지를 뒤로한 채 살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감정의 회한, 아니 정확하게는, 한탄하기에 너무나 불쑥 등장해서 무력감까지 자아내는 붕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말이다. 과거의 여느 때처럼 그것을 은폐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지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따금씩 우연은 상상의 기폭제 마냥 등장하기도 한다. 《Romantic Fantasy》(공간 413, 2021)에서 <지난날의 구토>는 답신인 <뱉는 일과 삼키는 일>(2021)과 함께 전시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 그리움의 감정을 헤아리게 하는 H의 편지와 다르게 J의 답장은 오히려 애정이 어린 대사를 읊고 있지만 동시에 담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회한보다는 다짐의 감정이 그곳에 있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 개인이 흘려온 서사를 암시하는 역할의 사진들이 등장한다. 특히나 <동반자Companion>(2021)는 누워있는 누군가를 발치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면서, 전시장 바닥과 거의 맞닿게 큰 사이즈로 인해 그 침대의 시선에 함께 참여하게끔 한다. 그가 발을 딛고 있는 HIV/AIDS의 세계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형체를 한 동반자의 존재는 매우 구체적이다.

외줄타기
“그렇게 되면 춤추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외줄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춤추는 게 외줄이거나, 외줄이 튀어오르게 하는 것이 네 이미지라면, 너는, 대체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죽음은 네가 추락하여 뒤따라갈 그것이 아니라, 외줄 위의 네 등장에 앞서 나타나는 그것이다.”[9]
그의 대부분 영상에는 내레이션이 음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J의 답장인 <뱉는 일과 삼키는 일>(2021)과 <Nuance>(2022)에는 대사를 읊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는 마치 감상자에게는 정확한 발성과 톤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Nuance>는 더더욱 개인적인 서사가 드러나는 42장의 사진으로 영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진들은 HIV 감염인과 그의 음성인 연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후 이 사적인 사진들은 개인전 《Hazy Scenes》(엘리펀트 스페이스, 2023) 개인전에서 <허물Skins>(2023)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불특정 주인공>(2023) 역시 그 맥락에서 서로 미묘하게 바뀌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작가의 서사가 전면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퀴어성과 HIV/AIDS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적으로 서술하며 전달하지 않는다. 내러티브와 함께 짝을 짓는 이미지들이 그 아무리 사적이고 구체적일지라도 작가는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로 구분되지 않는 보통의 언어로 감정의 흐름을 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로제 카유아와 조르주 바타유를 통해서 보이스 그로이스가 감염과 만남을 분석하는 대목은 전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카유아는 전염되는 신성성에 대한 관점에서 전염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타자와의 만남에서 안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바타유는 분해되는 시체에서 궁극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10] 세속과 신성의 구분법에서 바타유가 주목하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체이다. 신체가 분해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흐름으로, 그 공통 인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안전한 개인이 아닌 소멸하는 순간이 타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순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술과 작가의 관계성은 장 주네가 한 시에서 이야기한 외줄타기의 관점에서 유비적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외줄을 올라간 이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너를 쓰러트릴 것이라는 땅바닥이다. 더욱이 이는 사회 속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소수에 작가가 속할 때 더 크게 다가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가까운 이에게조차 그 불안감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불특정 주인공’은 당신과 나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는 감각들을 되새겨보고, 나누고, 함께 읊조린다.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동반자의 신체는 여기에서 다시 흩어지는 말들로 넓게 퍼지면서 ‘나’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아랫입술과 이빨
‘나’에게 퀴어는 이해의 실패를 그림자로 두고 있는 말이다. 인용부호 속에서나 안전하게 소환될 수 있을 것이다. 소화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인용부호를 삼켰을 때 무엇이 남는가. 그것은 타인과 질병 사이에 있는 이해 불가능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HIV/AIDS와 퀴어의 특수한 지반에서 사랑하는 타인으로 이어지는 김재원 작가의 작업은 인용부호를 기꺼이 덜어낸다.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적인 이야기로 옮겨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감히 연속되는 순간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파도로 덮어두던 모텔 바닥, 몸을 뉘었던 침대 가장자리, 아랫입술과 이빨 사이 마침표가 없는 문장같은 것들.
당사자성에 닿지 못하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사를 인용하게 하는, 이해라는 기만을 시도하게끔 하는, 퀴어와 질병과 사이에서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해 본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멀미들. 오독으로 전염되는 감정 앞에서 비평이 무력해지는 그 순간들. 이는 수많은 인용부호를 삼키고 거센 물살에 몸을 맡길 때 서늘해지는 목구멍의 감각이다. 눈앞에 벌린 입은 이야기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일까. 우습게도 나는 그것이 퍽 따스하다고 착각하면서, 흔쾌히 전염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
[1] 필자의 일기(2014년 9월 16일, 화요일).
[2] 김재원 작가의 영상 작업에서는 ‘나’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 원고의 ‘나’는 인용부호와 함께한다. 이는 수잔 손택의 ‘캠프’에 대한 문구에 기반한다. “캠프는 모든 것을 인용부호 속에서 본다. … 사물과 사람에게서 캠프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역할 수행자Being-as-Playing-a-Role로 이해하는 것이다.” 수잔 손택, 「‘캠프’에 관한 단상」,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2), p. 416.
[3] 앞의 책, pp. 434-435.
[4] Jack Babuscio, “The Cinema of Camp (AKA Camp and the Gay Sensibility,” Fabio Cleto (ed.), Camp: Queer Aesthetics and the Performing Subject: A Read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p. 117, p. 134.
[5]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p. 13.
[6] 전시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리플렛을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나’에게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오래 남겨져 있는 ‘모텔 일회용품’이 되었다.
[7] 앞 책, pp. 14-16.
[8] 아니 에르노, 『이브토로 돌아가다』, 정혜용 옮김 (파주: 사람의 집, 2023), p. 44. 그의 자전적인 소설 『단순한 열정』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에이즈라도 남겼기를 바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9] 장 주네, 『사형을 언도받은 자/외줄타기 곡예사』, 조재룡 옮김 (서울: 워크룸프레스, 2015), p. 134.
[10] Boris Groys, “The Infectious Sacred,” Philosophy of Care (London and NY: Verso, 2022),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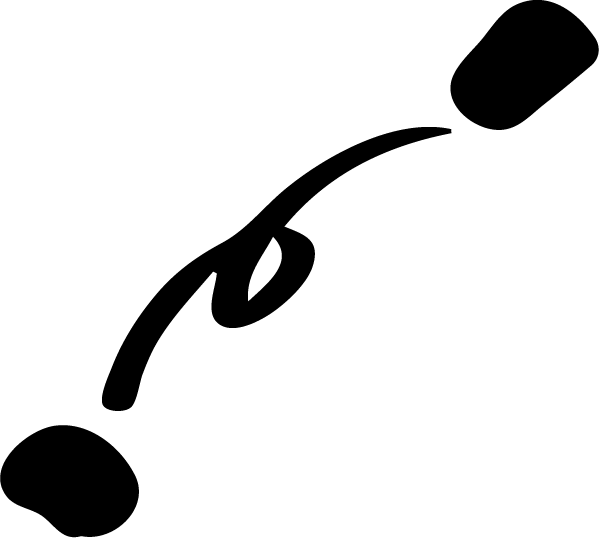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