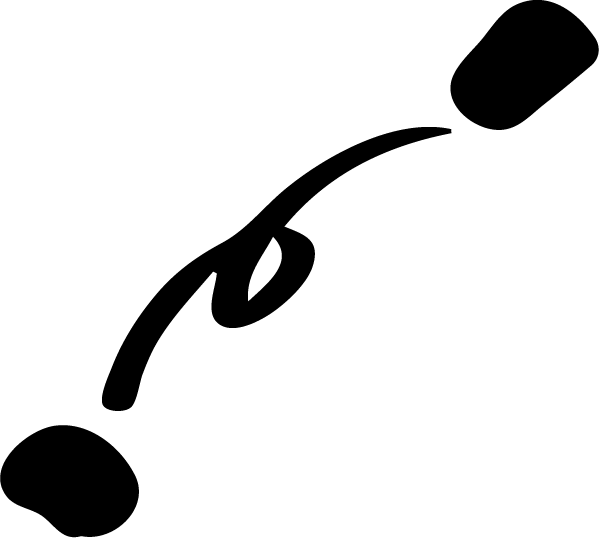우선 진보라는 주제부터 살펴보자. 역사가 어떤 운명 위에서 전개되는지를 역설한 헤겔의 관점은 꽤 흥미롭다. 그 생각은 일면 진보적 느낌을 자아내고 있지만, 자유라는 개념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역사적 원동력을 우리나라의 맥락에 더 적합한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 후쿠야마의 이론은 다소 단순한 데가 있다. 전 세계가 운명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취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나라를 구제한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5] 현대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적으로 앞선 다음에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나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단순히 덤일 뿐이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어, 나는 중국몽을 통해 명확하게 적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 방법은 현재의 소속감을 보다 강화하고 도전에 맞서려는 의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중국몽’이라는 말에서처럼 특정 국가를 연결시키는 발상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연계는 보편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강대국의 거대 서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역사는 창의적으로 다시 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말하지 못한 목소리조차 차츰 들릴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도 있다.